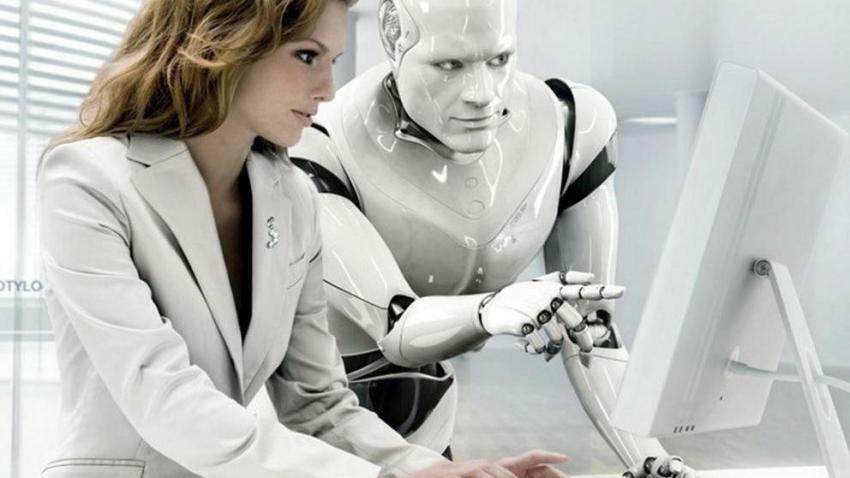산재와 관련된 여러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통해 산재와 관련된 통계적 사실들을 살펴보며 그 의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다시 크게 진폐증, 뇌심혈관계질환(과로), 근골격계질환, 기타 질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떤 경우에 평균적으로 보험급여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 통계는 이렇습니다.
2019 | 1인당 지급액(원) | |||
합계 | 소계 | 320,184건 | 5,529,359,774,460원 | 17,269,319 |
|
|
|
|
|
사고 | 소계 | 256,374건 | 3,767,570,916,690원 | 14,695,605 |
질병 | 소계 | 63,810건 | 1,761,788,857,770원 | 27,609,918 |
진폐 | 18,977건 | 492,637,903,550원 | 25,959,736 | |
뇌심 | 16,133건 | 541,131,996,020원 | 33,541,932 | |
근골 | 14,744건 | 281,984,426,910원 | 19,125,368 | |
CS2 | 763건 | 33,930,177,670원 | 44,469,433 | |
기타 | 13,193건 | 412,104,353,620원 | 31,236,592 | |
1. 공단이 5조나 썼네요?
가장 먼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환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5조 5천억 원을 넘겼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생각보다 공단 지출액이 크다는 걱정은 넣어 두셔도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버는 돈보다 근로자에게 쓴 돈이 더 많았던 해는 1991년부터 2019년의 30년 세월 동안 단 세 번뿐이었고, 가장 손해를 크게 본 해인 2003년의 수지율도 100.7%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2019년의 수지율은 73.3%로, 2조 넘게 남겼습니다. 더 써도 괜찮을 듯합니다.
(* 수지율: 수입과 지출의 비율. 수지율이 클수록 적자.)
2. 산재 발생 시 평균 얼마를 받나요?
위 표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하자면 사고든, 질병이든 산재 한 건당 근로자가 받는 평균적인 액수는 1,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해당 액수는 모든 종류의 보험급여가 다 포함된 액수이므로,
내가 만약 평균 액수보다 적은 보상을 받았다면
① 다행히 부상의 규모가 작거나,
② 평균임금이 적거나,
③ 아직 청구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다는 것입니다.
①의 경우라면 다행인 일이고 조정할 방법이 없지만,
②와 ③이라면 전문가인 노무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했을 때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고와 질병의 비교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인당 평균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질병(직업병)이 발생했을 때는 1인당 평균 2,700만 원을 받았네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보상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에 비해 평균 보상이 큰 데도 많은 분들께서 직업병 산재 보상의 가능성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개인 질환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4. 어떤 경우가 가장 평균 보험급여가 많나요?
발생 가능성이 낮은 CS2 노출 질환의 경우를 제외하면 직업병의 평균 보험급여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 질병의 종류 | 인정 건수(건) | 1인당 지급액(원) |
1위 | 뇌심 | 16,133건 | 33,541,932 |
2위 | 기타 | 13,193건 | 31,236,592 |
3위 | 진폐 | 18,977건 | 25,959,736 |
4위 | 근골 | 14,744건 | 19,125,368 |
(1) 1위: 뇌심혈관계질환
가장 많은 평균 보험급여를 받은 직업병은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등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뇌심혈관계질환이었습니다. 산재 승인 시 평균 3,300만 원을 받았죠.
뇌심혈관계질환이 1위인 이유는 ▲ 사망 사건의 비율이 높고, ▲ 사망이 아니더라도 예후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 치료 장기화에 따른 거액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의 지급, ▲ 고등급의 장해급여 지급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2) 2위: 기타 질환(직업성 암 포함)
기타 질환이 그 뒤를 잇습니다. 기타 질환에는 직업성 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 역시 뇌심혈관계질환과 마찬가지로 ▲ 사망률이 높고 ▲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점에서 보험급여액이 많지만, △ 장해급여의 등급 문제로 인해 평균 보험급여액에서 뇌심혈관계질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3) 4위: 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 질병 중 평균 보험급여 지급액이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이는 ▲ 치명률이 적은 상병 특징에 기인한 것이며, ▲ 평균의 문제도 있습니다.
즉 평균 보상액이 낮아 보이지만 인공관절 등 근골격계질환 중 특수한 경우라면 1억 이상의 보상도 충분히 가능하여 2,000만 원이라는 평균 보상금액이 무색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5. 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사실 위 통계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액수가 아닌 “신청 건수”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 건수는 256,374건인 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건수는 63,810건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신청 건수가 사고 건수의 1/4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발생 건수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① 자신의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을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고,
② 업무상 사고에 비해 훨씬 세심한 준비가 필요함에도 전문 조력 없이 신청하여 불승인되는 케이스가 많으며,
③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1년에 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 케이스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인에게 어떤 질환이 발생했다면 산재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셔야 하며, 업무상 질병의 산재 신청의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너울은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